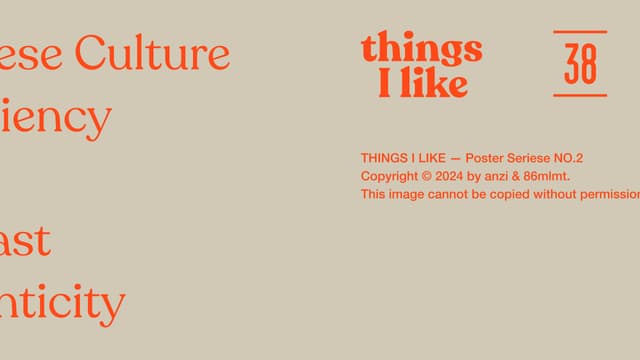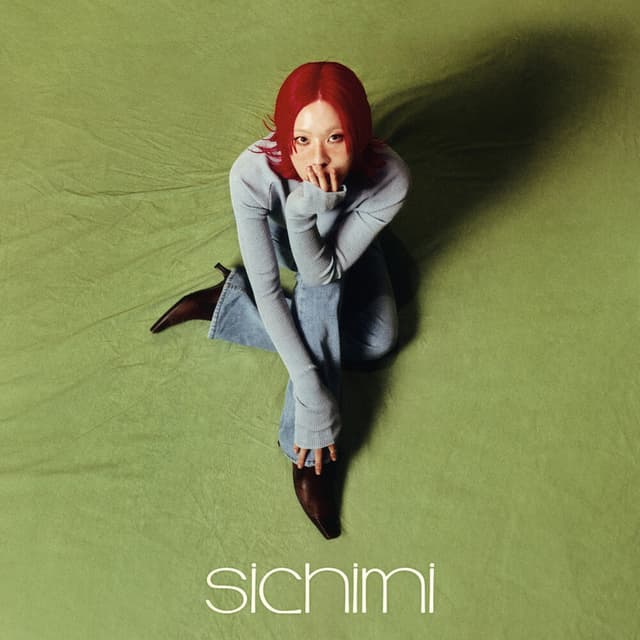아는데 낯선— 끌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흔히 생각이나 행동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모순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또 새로운 것에 설렘을 느낀다. 이성에게 끌렸던 감정을 떠올려 보면 익숙한 듯 낯선 그 미묘한 경계에서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곤 한다.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어떤 날에는 쉽게 허용되기도 한다.
뭔가에 끌린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새로운 환기가 일어나는 경험이다. 알고 있는 범주라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에일리언 중에 가장 잘생긴 에일리언을 만나봤자 매력보다는 공포가 앞 설 것이다. 유행이 10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말처럼 어떤 흐름이 지겨워질 때 이전에 알던 것이 낯설어지는 시간이 찾아온다.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고 약간의 새로움을 얹어서 찾아온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흔해지면 우리는 또 다른 ‘알지만 낯선’ 것을 찾아 나서게 된다.
정반합. 맞다. 유키즈의 민희진 편에서 정반합을 언급한 대목에 깊이 공감했던 기억이 난다. 과거에는 TV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 범위도 컸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민희진의 레트로 감각이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달라진 세대를 고려한 조금 다른 문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반(反)이 지나치게 거칠고 강하면 합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정반합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절묘해야한다. 특히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와 정서적으로 동떨어질 위험이 크다. 이는 창작자가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쌓기 때문이다. 어느 평론가의 평가가 일반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문화 소비의 흐름을 보면, 다수가 공유하는 경험보다 훨씬 더 개인으로 쪼개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어느 정도의 공유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조각난 형태로 개개인 각자의 유니버스가 강해지는 것 같다. TV와 다르게 내가 보는 유튜브를 너도 볼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려워졌다. 내가 듣는 음악이 너도 들을 것이라는 기대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모두를 아우르는 슈퍼스타가 나오기는 어려워졌지만, 개인들이 덕질하는 문화가 조성된 듯하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비주류 문화는 경험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그 때는 미국이나 일본 문화를 동경했었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비주류 문화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세계의 문화를 쉽게 소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 한국 내 비주류 문화라도 세계 무대에서는 상당한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적 취향에 맞는 문화 소비가 가능해졌다. wave to earth가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고 역수입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이런 시대에 ‘아는데 낯선’ 느낌을 찾고 만드는 것은 메가 히트는 조금 힘들어졌지만 작은 기회는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포착하고 각자의 유니버스를 만드는 것은 창작자에게 중요한 숙제처럼 다가온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방정식을 만들고 싶어하지만 이 것을 공식화하기는 어렵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후적으로 말하는 성공 방정식 안에는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있다. 그런 변수들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어설픈 공식은 언제나 오답을 만들어낸다.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는 이러한 과정을 ‘소수 찾기’에 비유한 적이 있다. 소수의 불규칙한 연속성처럼, 이 거대한 불규칙성이 흔히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성공 공식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를 공식화할 수는 없더라도, 그 과정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공식일지도 모른다. 몰입을 통해 탐구하는 즐거움을 느끼다 보면 ‘아는데 낯선’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신기루이기 보다는 몰입의 과정 속에 언제나 숨어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술래의 임무는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히 잡히지 않는 술래라는 컨셉은 술래잡기 대본에는 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무던히 알지만 낯선 것을 찾는 시도를 해본다.